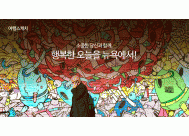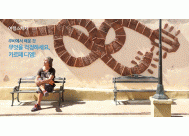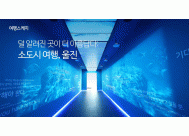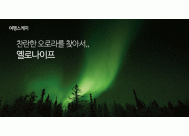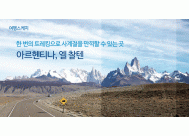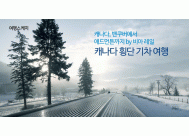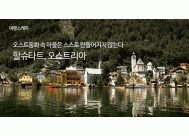오스트리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 인스부르크. 저녁엔 이곳의 민속 공연인 티롤을 예약해 두었다. 오전엔 잠시 인스부르크 시내를 둘러보고 오후엔 교외에 있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월드에 갔다가 공연을 보러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게 오늘의 일정. 우리 부부는 결혼식 때 그 흔한 커플링 하나 맞추지 않았다. 그것은 필자의 의지였고, 당시 전혀 섭섭하지 않았었기에 내가 보석에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 나도 여자였던가?’ 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반짝이는 수천수만 캐럿의 크리스털을 보자 그 황홀함에 빠져 연신 감탄과 찬양을 내뿜는 동시에 막상 내 손엔 하나 쥐어 보지도 못하고 돌아서야만 하는 가난한 여행자의 주머니 사정을 깨닫고선 인스브루크로 돌아오는 길, 괜스레 의기소침한 기분에 빠져있던 그때.

다행스럽게도 이럴 때면 나보다 더 내 기분을 잘 헤아리는 세심한 동반자가 항상 옆에 있곤 했다. “우리 잠깐 저기에 들렀다 갈까?” 그가 손을 뻗어 가리킨 곳엔 거꾸로 집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할 빨간 지붕이 땅바닥에 반쯤 처박혀 있고, 대문도 창문도 모두 거꾸로 달려있는 집. 지난 밤 안내 책자를 보고 지나가는 말로 “여기 가보고 싶지 않아?”라고 툭 던졌던 걸 기억하고 온 것이었다.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도, 부엌도, 화장실도, 침실도 온통 거꾸로. 식탁도, 침대도, 변기도, 인형도, 장난감도모두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심지어 차고의 자동차마저 거꾸로였다. 그게 뭐 대수라고 다 큰 어른이 설레발이냐 싶겠지만 머릿속으로만 하는 상상과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는 엄연히 달랐다. 꿈속 혹은 만화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 마룻바닥이어야 하는 곳에 천정이 있었고, 거꾸로 된 (사실은 그림만 거꾸로 그려진) 계단을 걷자니 나도 모르게 비틀비틀 휘청거리더란 말이다.

“아니야, 좀 더 진짜처럼 매달려 봐”, “응, 그렇게! 그렇게!”, “발을 바닥에서 떼야 진짜 매달린 거 같지” 라며 우리는 아이 마냥 낄낄거리며 부산스럽게 온 집 안을 헤집고 다녔다. 한 장의 완벽한 거꾸로 사진을 찍기 위해 매달리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기를 반복하며 참 신나게도 놀았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 해가 붉어질 때가 되어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는 예약해 놓은 공연 시간에 늦을세라 부랴부랴 다시 인스브루크로 향했다. “오래간만에진짜 최고로 재밌었어!” 난 언제 우울했었냐는 듯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신 재밌었다고 함박웃음을 띠며 얘기했다. 필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그곳에 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더 신나게 잘 놀았다는 후문.

밧줄 하나에 나를 맡긴 채 천길만길의 낭떠러지로 몸을 날렸던 에콰도르에서의 아찔한 번지점프, 스쿠버다이빙을 배운 후 카리브해에서 처음 느껴본 고요한 바닷속 깊고 푸른 황홀감, 지구를 구할 마지막 탐험 대원라도 된 듯 온몸을 던져 만끽했던 청정 자연 스위스에서의 캐니어닝 등 사실은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평생토록 잊지 못할 체험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 대단했던 순간들에 비하면 거꾸로 만든 집에서의 체험이 도대체 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인지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행의 추억이란 건 객관적 기록보다는 그 이전 혹은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당시의 기분이 어땠는지 등 지극히 주관적이고도 개인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눈은 호강했지만 결론적으로 손에는 쥘 수 없었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월드에서의 허무함 vs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마주보며 마음껏 웃고 즐기며 남긴 사진 한 장의 만족감.’ 어쩌면 내가 경험한 것들 중 가장 보잘 것 없고 소소했던 거꾸로 집 체험이 내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인상적이었던 체험으로 기억된 것처럼 말이다.


오재철과 정민아 부부는
결혼 자금으로 414일간 세계 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 다시 어딘가에서』, 『함께, 다시, 유럽』 을 출간했다. 이후 남편은 여행 작가와 사진 작가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아내는 여행 기자와 웹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딸과 함께 떠나는 가족 세계 여행을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