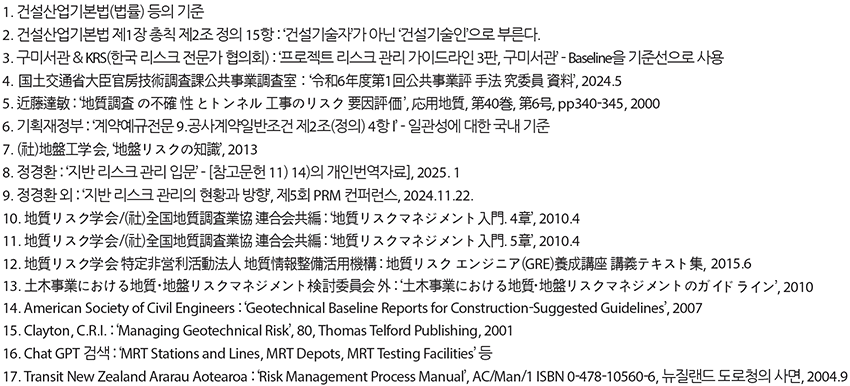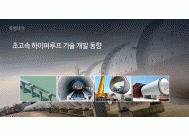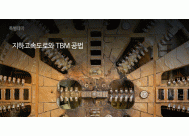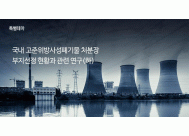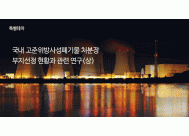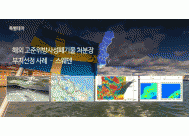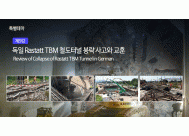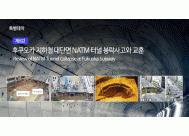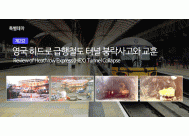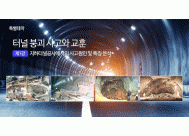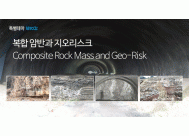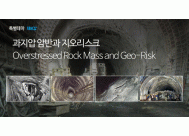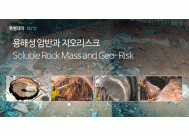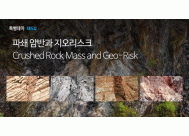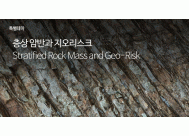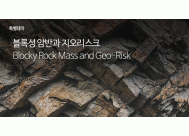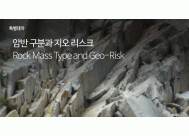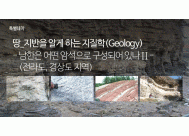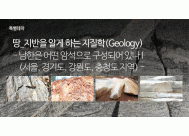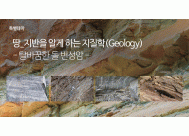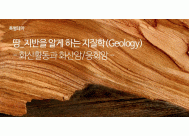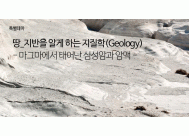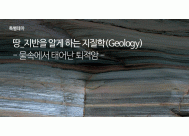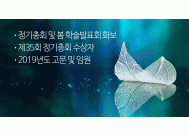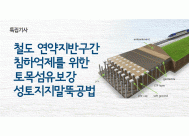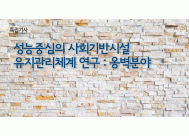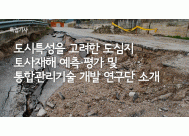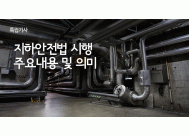정 경 환
(재)영남건설기술교육원
전임교수
(indosuru@hanmail.net)
1. 서론
건설현장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 리스크 중에서, 지반공학적 문제에 의한 지반 리스크(Geotechnical Risk), 발주와 계약에 관련된 리스크 및 기술인의 전문지식 부족이나 판단의 오류로 인한 휴먼 리스크(Human Risk)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외국의 설문자료4)에 의하면 리스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본인은 지반공학 기술인으로서, 리스크 중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반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지반 리스크 관리(Geotechnical Risk Management)분야에 대해서 지난 2년 남짓 외국문헌을 조사하고 번역한 내용을, K-Risk(한국 리스크 전문가 협의회)의 컨퍼런스에서 발표9)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지반 리스크 관리의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우리가 종사하는 주문제작형식의 다양한 건설현장에 숨어있는 리스크 요소들을 지반공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지반공학 전공의 기술인은 기술적인 관점(지반조사와 탐사, 시험, 품질관리 및 해석적인 수법, 시공장비의 개선과 공법개발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에서 노력해 왔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의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하면(즉 지반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장의 리스크를 분야별 전문인(SME)인 지반공학 전문인의 관점뿐 아니라, 계약과 보험, 법령과 재판까지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리스크의 영역에 포함된다. 일본지반공학회는 이런 광범위한 영역을 취급하는 지반 리스크 관리에 관한 도서를 12년 전에 출간7)하였다.
금번 게재내용은 광범위한 지반 리스크 관리 분야의 자료 중에서, 미국토목학회(ASCE)에서 출간한 도서를 토대로 편집하고, 본인이 숙지한 다른 자료 및 의견을 첨가한 것이다. GBR(Geotechnical Baseline Reports)은 지반해석보고서(GIR : Geotechnical Interpretive Report)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반 리스크(Geotechnical Risk)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새로운 계약 해석 기준선3)(Baseline)을 마련하기 위한 배경과 개념, 목적 및 적용범위를 설명한다.
1.1 GBR 목적
GBR은 지하건설공사 계약서의 지반상황을 설명하는 유일한 서류로, 예상되는 지반조건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의 리스크를 적절히 분담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해석적인 지반 보고서들이 애매모호한 설명과 계약서류와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정량화된 기준선(Baseline)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1.2 GBR 개발 배경
초판 발행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건설업계의 여러 포럼에서 실무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1997년에 초판을 출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하건설에 관련된 다양한 계약서류와 실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GBR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지반상황과 관련된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하고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판 개정
터널과 수직구 공사뿐 아니라 깊은기초, 관로(Pipeline), 흙막이 굴착 등 지반공학의 다양한 분야로 GBR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감에 따라, 2004년 이후의 추가적인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제2판(개정판14))이 2007년에 출간되었다. 이 개정판은 초판에 비해 실제적인 적용사례와 검토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을 종합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명확한 지침서(Guideline)를 제공한다. 일본어 번역판11)과 한글 번역판8)은 개정판을 토대로 한 것이다.
번역 및 편집 과정
일본의 지질 리스크 학회는 미국토목학회(ASCE)에서 발간한 개정판(제2판)14)을 번역 출간하였다11). 본인은 일본어 번역판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용어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ASCE 원문도 참고하였다. 또한 완역한 자료8)를 Chat GPT(o3-mini)로 요약하고, 본인이 숙지한 다른 자료와 의견을 추가하여 편집했다.
1.3 공헌자와 헌정
기술위원회와 주요 공헌자
GBR(지반 기준선 보고서)의 개발에는 지하건설공사 기술연구협의회 산하의 지반보고서에 관한 기술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판 작성 시에는 Randall J. Essex를 비롯하여 Peter Douglass, James Monsees, Robert Pond 등 여러 전문인들이 참여하였고, 제2판 개정 시에는 2006년에 다시 모인 전문인 그룹(Daniel Meyer, Bart Bartholomew, James Morrison 등)의 경험과 최신 정보도 반영하였다.
헌정 대상
GBR 분야의 발전과 ASCE 원문 작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에게 헌정되었다.
● James P. Gould : 뛰어난 재능과 문제해결능력을 토대로, 지반과 관련된 분쟁결과 해석적 보고서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미국 국회도서관 등에서 그의 경력을 인정받았다. Harvard 대학에서 Arthur Casagrande와 공동으로 연구하였고, 1995년 7월호 Journal of Geotechnical Engineering에서 발표한「지반의 분쟁해결」의 지하건설공사의 계약분쟁에서「상이(相異)한 현장상황(DSC : Differing Site Condition)」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지하건설공사에서 GBR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Eugene B. Waggoner : 토목지질학 분야의 선구자이자 전문인으로서, 초기 지반보고서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의 인격과 전문성은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심장수술로 일선에서 은퇴한 이후인 70대에도 시니어 엔지니어의 역할을 다 한 모습이 귀감이 되었기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4 평가의 필요성
● 분쟁예방 및 해결 : 북미의 지하건설 프로젝트에는, 과거 애매모호한 지반 해석 보고서(GIR)로 인한 분쟁과 소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 전문기관의 평가 : 이 과정은 미국토목학회(ASCE)와 관련 단체들의 후원과 평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1.5 지반 기준선 보고서(GBR)의 개념과 사용
● 배경 : 기존의 입찰자들은 설계단계에서 수집된 지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사용했지만, 이로 인해 실제 현장조건과 차이가 발생(DSC)하면서 추가비용의 청구나 분쟁(설계변경)이 빈번하였다.
● 개념 전환 : 발주자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설계자의 해석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지반 기준선 보고서(GBR)」라 명명하고, 계약상의 기준선(Baseline)을 명확히 하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게 하였다.
● 리스크 분담(Risk Share) : 암반용 TBM 프로젝트인 경우, 기준선과 동일하거나 더 단단한 지반조건으로 발주하는 경우는 상응하는 리스크를 도급자(수급자)가 부담하고, 기준선보다 현저히 연약한 지반조건으로 발주하여 실제 굴진능률이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발주자가 리스크와 추가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1.6 GBR의 주요 목적과 취급 범위
● 목적 : GBR의 핵심은 지하건설공사 중에 예상되는 지반조건을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제시하여, 입찰 시 유일한 계약의 해석 기준선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설계 근거, 리스크 평가, 공사 진행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취급 범위
① 발주자가 적합한 용역사를 선정하도록 필요능력과 경험을 명시한다.
② 설계자는 보다 정량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선을 마련한다.
③ 입찰자는 리스크 평가와 공사비 산출의 근거를 마련한다.
④ 계약서와 다른 서류의 일관성을 위해, 분쟁 시 판단할 기준선을 제공한다.
● 제2판(개정판)의 확대 적용 : 터널과 수직구뿐 아니라, 깊은기초, 관로, 흙막이 굴착, 고속도로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고,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DB)에서도 GBR의 적용과 집행 방안을 포함한다.
1.7 GBR 활용
GBR 권장 지침서(Guideline)는 단순한 기술 보고서를 넘어서, 프로젝트 초기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계약,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발주자와 도급자, 용역사 사이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다.
● 계약서에 명확한 기준선 제시 : 기준선은 계약서류 상, 예상되는 지반 조건을 설명하는 유일한 서류로, 예상치와 다른 지반조건이 공사 중에서 나타나는 경우의 리스크와 비용분담을 위한 기준선을 제공한다.
● 다양한 공법 및 프로젝트 적용 : 터널과 수직구뿐 아니라, 깊은기초나 관로, 고속도로공사 등에도 GBR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DB : Design-Build) 등 다양한 조달방식에서의 활용방안도 제시한다.
● 실무 경험의 피드백 : 제2판에서는 실제 프로젝트 적용사례와 분쟁사례를 통해 얻은 교훈이 반영되어, 향후 GBR의 보완과 발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GBR은 지하건설공사의 지반 리스크 관리와 계약분쟁예방을 위한 중요한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수의 전문인과 현장 실무자들의 경험과 연구 성과가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집약된 경험은, 향후 프로젝트 진행 시 실질적인 지침서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GBR 또는 지반 리스크 관리라는 이름이 아닌 제도1)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 등에서 활용하는 방법 즉, 지반공학 기술인2)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지반 리스크 관리에 의한 방법을 활성화하여, 지반공학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지반 리스크(Geotechnical Risk)를 저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배경 요약
2.1 개선된 계약의 실무
● 1972년 워싱턴 수도권 교통국은 터널건설공사입찰준비 시, 입찰자가 예상할 수 있도록 지반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별도의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 1974년 발행된 보고서(「Better Contracting for Underground Construction」)는 공정한 정산 보증과 합리적인 입찰가격 확보를 위한 기본요건을 제시하여, 터널건설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 1980년대에는 기존 법정보상청구방식의 한계를 인식한 담당자들이, 1984년 全美터널기술위원회(USNCTT)의 보고서를 통해 지반상황조사 및 해석 보고서(Check List 포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1989년 지하건설공사 기술연구협의회(UTRC)의 기술위원회도 최신 보고서를 통해 해석적 지반보고서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여, 계약상의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2 계약상의 지반자료보고서
● 과거에는 단순한 지반자료보고서(GDR : Geotechnical Data Report)만 준비되어서, 조사결과에 의존한 도급자 해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예상과 다른 지반상황이 발생(DSC)하면 분쟁이 빈번했다.
● 따라서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해석을 보완하고자, 별도의 지반해석보고서(GIR)를 도입하여, 자료와 통합한 서류를 계약서류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 1997년부터는 기술연구협의회(UTRC) 기술위원회가「지반 기준선 보고서(GBR)」라는 이름으로, 계약상의 기준선(Baseline)을 명확히 하고 리스크 분담(Risk Share) 원칙을 제시하는 해석 보고서를 정립하였다.
2.3 기존수법의 결점
● 기존의 지반해석보고서(GIR)는 기준선이 제공되더라도, 대충 설명하거나 애매모호해서 계약서나 도면 등 다른 서류와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다[이를 상이[相異] 또는 상호모순이라고 한다]6).
● 예상한 지반상황이 자의적이거나 불명확하여, 도급자가 실제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안전측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의 리스크 분담에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추가조사를 통한 확실한 기준선 해석과 서류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3. 지반보고서(Geotechnical Report)
지반자료보고서(GDR)는 프로젝트의 기초자료와 초기설계해석(지반양해각서)을 토대로,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의 계약상 기준선을 명확히 설정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지반 리스크 관리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3.1 지반자료보고서(GDR : Geotechnical Data Report)
● 목적 및 내용 : 설계자나 설계에 관련하는 지반공학기술인이 작성하며 지질 및 지반공학적 배경, 현장조사계획, 시추와 트렌치 조사기록, 현장 및 실내시험결과 등의 사실 정보를 상세하게 포함한다.
● 계약 내의 위치 : GDR은 계약서류의 일부로 포함되지만, 그 내용에서 모순이나 애매함이 발생하면, GBR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3.2 설계를 위한 지반양해각서(Geotechnical Memoranda for Design)
● 용도 : 다수의 설계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초기단계에 수집된 지반자료의 해석과 한계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다.
● 주요 역할
① 자료에 대한 초기 견해와 검토를 제공한다.
② 추가 자료의 필요성과 설계 대안을 논의한다.
③ 시공 및 인접시설의 영향을 평가한다.
● 특징 : 이 서류는 예비적 성격을 가지며, 계약서류에 포함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GBR로 대체될 예정임을 명확히 한다.
3.3 지반 기준선 보고서(GBR : Geotechnical Baseline Reports)
● 핵심 개념 : 도급자가 의존하는 유일한 해석적 보고서로, 계약상의 지반상황(기준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요구 사항 : GBR은 반복되거나 다르게 표현되어서는 안 되며 GDR, 도면, 시방서 등과 연계되어 일관성 있는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4. 상이한 지반상황 조항
상이(相異)한 지반상황(DSC) 조항의 역사, 표준화 및 변경과정을 통해, 계약서상의 기준선과 실제 지반상황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설명한다.
4.1 역사적 발전
● GBR의 주요 목적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선(Baseline)과 실제 현장상황의 차이(DSC)를 보완하는 데 있다.
● 최초의「변화된 현장상황(Changed Conditions)」조항은 약 100년 전인 1921년에 개발되었는데, 불리한 현장상황에 직면한 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후 표준계약조건에 포함(1926년)되어 미국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1968년 이후「변화된 현장상황」이라는 용어는「상이한 현장상황(DSC : Differing Site Conditions)」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통해 입찰 시 불확실성을 줄여서 입찰가격의 하락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불확실성이 클수록 입찰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4.2 표준 조항
● DSC 조항은 주로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 건축협회, 기술인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류에 포함되어 있다.
● 이 조항은 도급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예상 지반상황과 크게 다른 현장상황을 신속히 통지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이나 공사기간 등이 조정(설계변경)되도록 규정한다.
● 명확한 기준선 해석이 이루어지면, 실제 현장상황과의 차이를 쉽게 평가할 수 있어서 DSC 조항의 효용성이 높아진다.
4.3 표준 조항의 변경
● 수년간의 판례와 사법부 판단에 따라 DSC 조항은 일부 수정되었으나, 기본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 일부 발주자는 기준선보다 양호한 현장상황을 직면하는 경우, 도급자에게 계약금액을 반환하는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는 입찰동기를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따라서 DSC 조항의 지나친 적용은 도급자가 경쟁력 있는 입찰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발주자가 불필요한 비용분담에 처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5. 기준선의 개념
5.1 기준선(Baseline)
● 목적 : 지하건설 프로젝트에서 불확실한 지반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사결과와 기존자료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상의 기준선을 확립한다.
● 주요 내용 : 예상되는 지반이나 지하수조건, 재료의 양과 분포, 강도, 투수계수 등의 정량적(또는 필요 시 정성적) 정보를 포함하며, 표준규격(ASTM, ISRM, ASCE 등)을 활용해 명확히 정의한다.
● 리스크 분담(Risk Share) : 기준선에 제시된 지반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도급자 사이의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5.2 계약상의 가정
● 개념 : 기준선 서류는 계약상 예상되는 지반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조사 자료의 한계와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 예시 : 예를 들면, 지반조사에서 확인된 전석 수보다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전석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는 등, 자료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5.3 기준선 설정 위치
● 기준선 설정 : 프로젝트의 특성과 지반자료에 따라, 예상한 악조건(예: 전석의 수)을 기준선으로 설정된다.
● 예시 : 전석 기준을 300개로 설정하면 도급자는 그 조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100개로 설정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비용 정산(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 리스크 전가 (Risk Transfer) : 기준선 설정에 따라 입찰금액과 리스크 분담이 달라지며, 발주자는 초기입찰가격의 상승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
5.4 기준선의 보증 한계
● 정의 : 기준선은 계약상의 예상조건을 제시하는 서류이지, 실제 현장상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 용도 : DSC(상이한 현장상황) 조항의 관리와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5.5 다른 계약서류와의 일관성
● 연계 : GBR의 기준선에 대한 설명은 도면, 시방서, 계량 및 지불조항 등과 일관성6)을 유지해야 하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전체 계약서류의 이해도를 높인다.
● 효과 : 이를 통해 설계와 시공의 요구사항, 그리고 변경 제안(VE) 등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협의가 가능해진다.
[용어 정리]
1) 공사발주방법 :
①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DBB : Design-Bid-Build, 통상 일반입찰)
②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DB : Design-Build, 통상 턴키)
③ 민관투자협력방식사업(PPP : Public-Private Partnerships, 통상 민자사업으로 부른다) 등
2) Changed Conditions(변화된 현장상황). Differing Site Conditions(상이[相異]한 현장상황)
3) ‘Contractual Hierarchy’ : 일본어판은 ‘계층성(階層性)’으로, 본문은 계약상의 서열(적용 순서)를 의미하므로, ‘계약상의 계층’으로 번역.
4) ‘Desanding System = Sand Separation System’ : 통상 ‘디샌더’라고 부른다.
5) DRB(Disputes Resolution Board) : 분쟁해결위원회
6) DSC(Differing Site Condition) : 설계서와 현장상태와의 상이(相異) 또는 상호모순(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름) - 일본어판은「상위(相違)한 현장상황」으로 번역.
7) GBR(Geotechnical Baseline Reports) : 본문은 K-Risk(KRS : 한국 리스크 전문가 협의회 - https://www.kr-risk.org)의 기준선(Baseline)에 따라 ‘지반 기준선 보고서’라 번역. 일본어판은 ‘지오테크니컬 베이스라인 리포트’라고 번역.
8) GDR(Geotechnical Data Report) : 지반 자료 보고서
9) Geotechnical Risk(지반 리스크) : 지질분야에서는 지질 리스크(Geological Risk) 또는 리오 리스크(GeoRisk)라고도 부른다.
10) GIR(Geotechnical Interpretive Report) : 지반 해석 보고서
11) ‘Identification of Risk Factors’ : 일본어판은 ‘리스크 인자의 동정(同定)’으로, 본문은 ‘리스크 요소의 식별’로 번역.
12) ISRM(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 국제암석역학협회
13) USNCTT(US National Committee on Tunneling Technology) : 全美터널기술위원회
14) UTRC(Underground Technology Research Council) : 지하건설공사 기술연구협의회
참고문헌